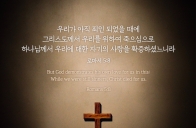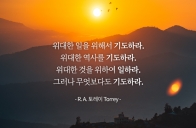미성숙한 사랑은 나의 필요를 상대로부터 채우려 하고
성숙한 사랑은 나의 충만한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성숙한 사랑의 4가지 핵심 요소는 보호·책임·존경·지식
 |
독일이 낳은 에리히 젤리히만 프롬(1900. 3. 23~1980. 3. 18)은 유대 전통과 인문주의,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로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사랑론(愛情論)은 성경의 아가페 사랑과 맞닿은 부분이 많아 기독교적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를 보게 된다. 오히려 기독교 현장에서 일반 인문학적 언어로 사랑을 설명하면서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다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고등학교 때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 흥미를 갖고 연애의 무슨 좋은 방법과 기술이 있나 하고 열심히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사실 그가 말하는 ‘사랑의 기술’은 연애 감정을 잘 표현하는 어떤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평생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훈련이란 의미로 썼다. 필자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선교지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에 의하면 사랑엔 미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이 있다고 했다. 미성숙한 사랑은 나의 필요를 상대로부터 채우려는 것이고, 반대로 성숙한 사랑은 나의 충만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프롬은 사랑이 전적으로 ‘주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성숙한 사랑에는 다음의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것에 대해 차례로 간략히 살펴보면서, 이런 사랑이 어떻게 선교지에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첫째는 ‘보호’ 혹은 ‘배려’(Care)이다. 흔히 보호는 상대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보호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프롬은 말한다. 정원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는 식물이 잘 자라도록 물과 햇빛과 바람을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그러니까 보호의 참 개념은 상대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 프롬은 흔히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 시대의 풍조에서, 오히려 상대의 성장과 도움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여 주는 행위를 사랑으로 보는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된다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선교지에 적용해 본다면, 현지인을 사역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대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무조건 베풀거나 지도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믿음, 구원, 은혜, 성장, 교육, 의료 등 실제적인 모든 필요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감으로써 같이 기뻐하는 행위가 곧 선교지에서의 사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책임’(Responsibility)이다. 흔히 책임의 정의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상대의 어렵고 힘든 짐을 내가 짊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프롬이 말하는 책임은 그런 것이 아니다. 책임이란 영어로 ‘responsibility’인데 이는 ‘response’(반응)와 ‘ability’(능력)가 합친 단어다. 진정한 책임이란 상대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 시대는 상처와 상실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럴 때 상대의 상실과 상처에 대해 무관심이나 회피가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책임의 참 의미란 말이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치가 누군가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슬픔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책임이란 그의 슬픔을 무조건 짊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슬픔에 반응을 하며 또한 공감하면서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선교지에 적용한다면, 선교사의 사역 방향을 나의 주도가 아닌, 현지인의 목소리와 상황에 일단 반응하며 그 방향으로 사역을 설정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기성 사역(숫자, 건물 건축 등)보다는 장기성 사역(제자 양육, 자립, 공동체 형성 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다. 교회를 세워주기보다는 그들이 세울 수 있도록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존경’(Respect) 혹은 ‘존중’이다. 흔히 존경이란 뛰어난 사람에 대한 높임이나 경외감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프롬이 말하는 존경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존경(respect)이란 단어의 원어는 ‘respicere’에서 왔다고 한다. 이 말은 강요하지 않고, 상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가치관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존경은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선교지에 적용한다면,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 문화, 언어, 전통 안에 복음이 상황화(Contextualization)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서구식 모델을 무조건 이식하지 않고 현지교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예배 형식과 절차, 찬양, 리더십을 현지 방식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다.
넷째는 ‘지식’(Knowledge) 혹은 ‘이해’이다. 흔히 지식이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지만, 프롬이 말하는 진정한 지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의 본질을 꿰뚫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의 상처나 숨겨진 두려움이나 혹은 잠재된 능력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나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알아가는 데서 상대에 대한 이해(지식)도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깊은 내면을 종종 들여다보는 묵상이 필요하다.
 |
김영휘 목사/선교사(KWMA 운영이사, 시니어선교한국 실행위원, 서울남교회 은퇴목사)














![[이미지 묵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5/5-17.jpg?w=196&h=128&l=50&t=40)
![[이미지 묵상]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4/9-27.jpg?w=196&h=128&l=50&t=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