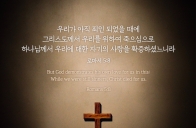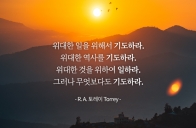|
휴전을 한다고 했지만 고지 전투는 멈추지 않았다.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 장군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한국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아들들을 직접 가서 데리고 오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1952년 12월 2일, 한국을 방문해서 72시간이나 머무르면서 유엔 총사령관 클라크와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를 만나서 전황 보고를 받았다. 우남과는 잠깐씩 2번이나 만났지만 우남이 제의하는 환영식을 끝내 거부했고, 오직 전쟁을 빨리 끝내고 휴전을 진행하라고 독려했다.
북경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회의가 열렸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회담이지만, 휴전을 탐색하는 공산권의 변화된 모습이었다. 유엔 측은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중립국으로 보내주자는 제의를 하며 휴전회담을 요망한다.
1953년 3월 5일 소련의 절대 권력의 일인자요, 한국전쟁의 조종자인 스탈린이 사망했다. 후계자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말린코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 중, 소 회담 때 주은래 중국 측 대표는 인도 측의 제의를 받아들인다. 소련도 말없이 받아들인다.
1953년 4월 11일, 드디어 부상 포로 교환 협정에 양측이 서명했다. 4월 20일부터 유엔군 213명, 미군 684명, 한국군 471명과 인민군 6,670명의 부상병이 교환되었다. 유엔 측은 거제도에서 배로 이송시키고 판문점으로 집결시켰다. 포로들은 북한의 사상 검증과 대우가 매우 두려웠다. 수용소에서 받은 치약, 담배, 양말, 심지어 상하의 옷까지 벗어버리고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남한의 이승만 정부에서는 휴전 반대 움직임이 점점 커졌다. 그 이유가 ①통일되지 않았다 ➁전쟁으로 다 잃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 ③다시 전쟁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휴전을 반대했다.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미 합참본부에 한국의 휴전 반대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다. 우남은 휴전을 반대하며, 오직 한국의 통일정부를 적극 소원하며, 미국의 한국안보 보장과 더 많은 경제 원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이승만이 직접 실력을 행사했다.
1953년 6월 18일 오전 2시, 유엔군이 감시하고 있는 2만 7천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포로 수만 명을 우남이 석방시킨 것이다. 우남은 포로들에게 민간인 옷을 준비해 주고 숨을 곳과 살아갈 길을 제공해 준다. 이에 워싱턴은 경악한다. 휴전협상 미 수석대표 등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
1953년 7월 19일 중부 전선의 금성(화천 북쪽) 중공군은 한국군 대대 진지에 1만 3천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다. 정일권 2군단장은 미 9사단과 한국군 5, 6사단이 전멸 상태라고 했다. 101km를 밀리면서 땅 한뼘 한뼘을 장병들의 목숨값으로 지켜냈다. 무엇보다 화천과 양구를 지켜냈다. <계속>
이범희 목사(㈔한국보훈선교단 이사장, 6.25역사기억연대 역사위원장)














![[이미지 묵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5/5-17.jpg?w=196&h=128&l=50&t=40)
![[이미지 묵상]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4/9-27.jpg?w=196&h=128&l=50&t=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