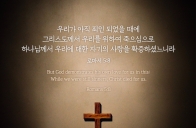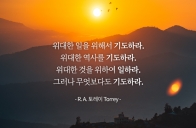|
소련 유엔 주재 말리크 대사는 유엔군에게 1951년 6월 23일 휴전을 제의한다. 모스크바는 북한 지원의 한계를 느끼며 3차 세계대전의 확산을 염려한다. 모택동은 중공 건국 1년 만에 세계 최강 대국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보였다고 만족한다. 그러나 너무나 희생이 크다. 더 이상 전력 소모는 중공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승리도 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었다. 전선의 병사는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고 본국의 미국인들은 염증을 느꼈다. 특히 맥아더의 무조건적인 한반도의 통일전쟁에 대하여 미 국무성은 휴전 협상을 지지했다.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가나안 특사를 홍콩으로 보내서 소련 말리크와 휴전을 협상하게 한다. 1951년 7월 10일 가나안 특사가 휴전을 제의한다. 말리크는 모스크바에 가봐야 안다고 했다. 미 국무성은 유엔에 휴전을 의뢰하고 소련이 동의한다.
공산군 측은 북한의 주장으로 회담 장소를 개성 인삼장으로 하되, 평화의 의미로 유엔 측이 백기를 달고 오라고 제의한다. 사실 개성은 3.8선 이남이다. 고려의 옛 수도이지만 전쟁으로 북한이 빼앗았다. 북한 측은 정치적으로, 심리적인 전술로 유엔군이 백기를 달고 오게 하고, 미국이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1951년 7월 10일 10시 개성의 인삼장 99칸의 한옥 요릿집(기생집)에서 유엔 해군 소장 죠이버크, 공군 소장 크레이거, 육군 소장 존 버넷, 한국군 소장 백선엽 장군이 중공군 소장 사방, 상좌-덩화, 북한 부수상 참모장 남일, 소장 강형산, 이상조와 마주 앉았다.
남일이 의자를 높이 해서 미군 장군보다 키가 크게 보이게 하고 무서운 눈초리로 계속 쏘아본다. 사실 이것은 휴전 협상이라기보다 공산 측이 증오심과 분노심을 크게 보이는 것을 연출하는 것이었다.
경무대에서 우남이 백선엽 장군을 불러서 차갑게 질문한다. “백 장군, 이 전쟁 통에 무슨 협상을 한다는 말인가?”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남은 단호하게 명령한다. 1) 이 전쟁은 북한이 불법으로 침략했고 2) 이미 수백만 명을 죽였고 3) 나라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4) 통일도 되지 않았다. 의미도 없고 명분도 없는 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오직 민족 통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제1차 휴전 협상은 1951년 7월 10일~26일 개성 인삼장에서 개최되었다. 회담 주제는 유엔군 측은 포로 귀환 등 9개 항을 요구했고, 북한 측은 외국 군대 철수, 3.8선 원상 복구(개성은 빼고), 포로 귀환 등 5개 항을 요구했다. 2~3일이면 회담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5일 만에 겨우 위의 주제를 선정하고, 군사분계선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계속 설전만 계속했다.
유엔사령부는 전군은 현 전선을 유지하되 전투를 금한다고 명령을 하달했다. 전선 유지의 명령은 이기지도 말고 지지도 말라는 뜻이다. 이미 병사들은 전투 의욕을 상실하고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다. 휴전 의제가 타결되니 피아의 국지전인 고지전이 치열해졌다. 유엔은 해주-고성을 휴전선으로 제의하고 북측은 3.8선을 고집한다.
우남은 휴전 협상을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며, 유엔군이 계속 휴전을 협상하면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여 통일 한국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남한 땅 전국에서 휴전반대 집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1951년 7월 3일 유엔군의 B-29 450대가 평양을 대대적으로 폭격한다. 휴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위협용이었다. 또한 동부전선 펀치볼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연합으로 대공세를 시작했다. 휴전 협상을 유리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공세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1951년 8월 22일 미군이 다시 개성을 폭격한다. 휴전 협상 과시용이다. 하지만 휴전협상장은 입씨름만 계속됐다. 너희가 협상 규칙을 어겼다, 책임져라는 식이었다. 한쪽에선 협상을 하지만 전선에선 치밀하게 땅을 뺏는 전투가 끊이지 않았다.
협상이 순조로우면 전투가 잠잠해지고 협상이 결렬되면 치열한 전투가 주야로 계속됐다. 휴전을 위한 회답은 계속되고 있지만, 고지 위, 아래에서는 피아의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홍안의 젊은이들의 시산혈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무한대의 애국심으로, 단 한 뼘의 땅이라도 확보하려고 귀중한 목숨을 내던졌다.
이범희 목사(㈔한국보훈선교단 이사장, 6.25역사기억연대 역사위원장)












![[이미지 묵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5/5-17.jpg?w=196&h=128&l=50&t=40)
![[이미지 묵상]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4/9-27.jpg?w=196&h=128&l=50&t=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