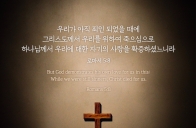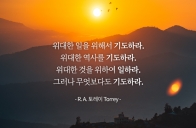묵상과 명상, 그리고 학제적 상위 개념으로서의 묵상적 수행(CP)
묵상적 수행(Contemplative Practices, CP)은 신경신학(Neurotheology)이 인간 의식의 심층적 변화와 신앙적 삶의 성숙이 신경생물학적 토대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주제이다. 묵상적 수행(Contemplative Practices, CP) 개념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한국어에서 자주 혼용되는 묵상과 명상의 어원적 유래와 학술적 용례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 둘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컨템플러티브 프랙티스(Contemplative Practices, CP)’를 ‘묵상적 수행’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채택된 배경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명상(Meditation, 瞑想)’과 ‘묵상(默想)’, 이 두 용어는 라틴어 ‘meditari’(‘숙고하다’, ‘반복하여 훈련하다’는 의미)의 뿌리를 공유하며 깊은 정신적 훈련이라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그러나 현대 학술적 맥락에서 기능이 분화된다.
명상은 현대 과학에서 주의 조절(Attention Regulation)과 정서 조절(Emotional Regulation)을 훈련하는 중립적인 기술 용어로 쓰인다. 호흡 주의, 바디스캔, 마음챙김(Mindfulness) 등이 대표적이다. 명상은 부정적인 생각의 되새김질을 줄이고 정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마음의 렌즈를 닦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반면, 묵상은 기독교적 맥락에서 인격적 대상(하나님)에 대한 관계 지향성을 강화한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과거에 받은 은혜의 기억(신앙 체험)을 떠올리는 것이 묵상 수행의 핵심적인 바탕이 된다. 묵상은 명상을 통해 조절된 마음 상태로, 말씀과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의미와 관계를 부여하는 일을 목표로 한다.
요약하면, 명상과 묵상은 기술은 겹치되 목적과 평가 기준이 명확히 다르다. 명상은 조절을 목표로 하고, 묵상은 그 조절 위에 성화(聖化), 곧 사랑과 용서로 드러나는 성품의 변화라는 의미와 관계를 부여한다.
2) ‘Contemplative Practices(CP)’를 ‘묵상적 수행’으로 규정하고 사용하는 이유
명상(기술)과 묵상(목표)의 구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이 둘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Contemplative Practices(CP)’를 ‘묵상적 수행’으로 해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어의 학제적 필요성과 연구 관행의 확산에 기인한다.
① 학제적 통합과 용어 선택의 필요성: 현대 과학에서 ‘명상(Meditation)’은 주의 조절이나 정서 조절처럼 측정하기 쉬운 기술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수행 맥락에서 명상은 본래 덕성, 자비, 지혜 등 인격적 덕목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이다. 특히 서구 영성 전통은 성경 텍스트를 읽고 능동적으로 숙고하는 단계(Lectio Divina, meditatio)가 깊은 관상적 통찰(Contemplatio)로 심화되는 연속적인 수행 방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순한 ‘명상’이라는 기법에서 출발해 관상, 덕성, 통찰과 같은 궁극적 목표로 심화되는 전 범위를 아우르기 위해, 이 전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묵상적 수행(CP)’을 규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용어 선택은 단순히 ‘주의 집중’에만 머물지 않고, 자비, 윤리, 목적성 등 인격적 변화까지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최근의 연구 동향과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대학교의 ‘CHM(Center for Healthy Minds 건강한 마음 센터)’이 웰빙을 구성하는 4가지 훈련 요소(주의·정서·연결성·목적성)로 모델링하면서, CP는 유연성과 지구력(주의·정서)뿐만 아니라 협응력과 균형감(연결·통찰·목적)을 통합적으로 기르는 종합적인 훈련 체계로 기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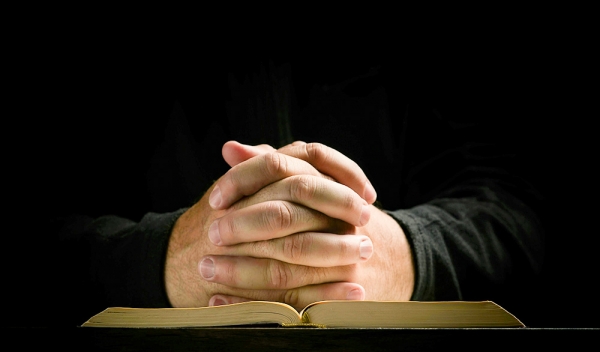
또한, ‘CMind(Center for Contemplative Mind in Society, 사회 속 성찰적 마음 연구소)’가 교육, 임상, 조직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실천 지형도인 ‘묵상적 수행 지형도(Tree of Contemplative Practices)’를 제시하며 현장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CHM 역시 ‘웰빙의 가소성’ 관점에서 CP를 훈련 기반 프레임으로 재구성하며 학제적 정착을 뒷받침했다.
학자들 중에서는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Varela)가 뉴로페노메놀로지(Neurophenomenology)를 통해 1인칭 경험과 신경과학의 접합을 제안했으며, 클리포드 새론(Clifford Saron)은 ‘샤마타 프로젝트(Shamatha Project)’를 통해 장기 집중 수행의 효과를 탐구하여 ‘주의’ 중심의 좁은 연구를 전인적 변화를 겨냥하는 넓은 의미의 CP 연구로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3) 묵상과 명상의 주요 차별점
앞에서 살펴본 명상과 묵상의 개념적 역할을 토대로, 두 수행 기법의 차이점을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명상과 묵상은 깊은 정신 훈련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그 지향점과 활용 방식에서 네 가지 핵심적인 차이를 보인다.
첫째, 대상성의 차이이다. 명상이 호흡이나 현재의 신체 감각과 같은 비대상적 주의 또는 현재의 경험 자체를 다루는 경향이 큰 반면, 묵상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대상에 주의를 고정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언어성의 차이이다. 명상은 사유나 개념을 내려놓는 비언어적 고요와 순수한 주의 집중을 중심에 두지만, 묵상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 수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
셋째, 목표의 차이이다. 명상의 목표가 주로 증상 감소, 스트레스 완화, 심리적 삶의 충만감이라는 개인적 만족감의 개선에 있다면, 묵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 자비, 용서와 같이 신앙의 열매로 드러나는 성품의 변화(성화)에 있다.
넷째, 관계 맥락의 차이이다. 명상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 조절에 머무르기 쉬운 경향이 있지만, 묵상은 ‘하나님-자기-이웃’이라는 관계 속에서 영적 의미와 사명을 완성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계속>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경기대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원장
美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 회장












![[이미지 묵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5/5-17.jpg?w=196&h=128&l=50&t=40)
![[이미지 묵상]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4/9-27.jpg?w=196&h=128&l=50&t=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