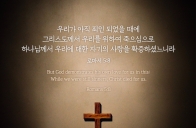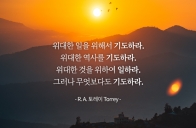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No Church without Mission)(방동섭, 생명의말씀사, 2010)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 바울 신학의 삶의 정황은 선교 그 자체
선교에 순종하는 동기는 빚진 마음, 하나님 사랑이 선교를 추진하는 능력
선교사의 삶이 곧 선교, ‘십자군 선교’ 아닌 ‘십자가 선교’ 정신의 회복이 시급
들어가는 말(서론)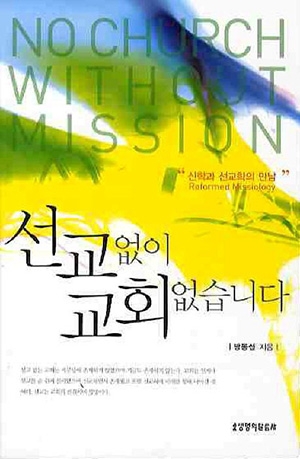
‘교회를 교회 되게, 신학을 신학 되게’, “신학과 선교학의 만남”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 선교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실패하였고 소수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다.” 거시적 세계 교회사를 새롭게 보아야 한다.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No Church without Mission)>(생명의말씀사, 2010)는 한국교회의 선교학 교수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는 저서이다. 통쾌한 ‘신학과 선교학의 만남’이다. 이것이 바른 개혁주의 선교신학(Reformed Missiology)이다.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학교 교수들의 추천사가 예사롭지 않다.
동료 교수들은 ‘21세기 신학계에 가장 의미 있는 저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가지고 가서 매년 1번씩 읽어야 할 책이다’, ‘누구나 선교를 말하려면 이 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선교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책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책이다’, ‘선교의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책은 지금까지 한국 신학계에 없었다’고 추천했다.
“선교 없는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언제나 선교를 숨 쉬며 살아왔으며, 선교하면서 존재했고 또한 선교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며 생명이다.” (방동섭)
방동섭 교수는 총신대, 총신대 신대원, 합동 신학대학원,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그랜드래피즈 칼빈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 잭슨의 개혁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1981년 미국에서 15년간 성경신학, 조직신학, 선교신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integration)연구했다. 선교학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연구하였기에 그의 선교학은 정체성이 독창적이면서 신선하다.
저자의 저서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입니다>(2001), <선교가 우리의 실존입니다>(2003), <영성을 깨운다>(2003), <위풍당당>(2008)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잠언을 접근했다. 백석대학교 기독신학대학원 선교학 주임교수. GMC(지구촌선교공동체) 설립.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부회장, KMQ(Korea Mission Quarterly)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이 책은 전체 7부, 곧 ‘선교와 신학/선교와 성경/구약과 선교/신약과 선교/선교와 교회/선교와 전략/선교와 컨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서평자는 신학이 선교와 입맞춤하는 저자의 비전에 따라 ‘신학과 선교학을 통합된 하는 관점으로’ 본서의 핵심을 요약하면서 서평할 것이다.
1. 신학과 선교의 패러다임: 선교학의 독립성과 보완성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다”
선교는 사실상 신학의 어머니다. 선교를 보는 시각은 신학적 입장에 따라 정의가 천차만별이다. 주후 1세기 신약시대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탄생했다. 당연히 교회가 시작될 때 오늘과 같은 신학이 존재하였을까? “교회의 신학은 교회가 주님의 명령대로 선교를 순종하는 과정에서, 또한 그 결과로 선교의 현장과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품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p. 18, 당연한 서술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Mission is mother of theology, David Bosh)라고 했다. 주후 1세기 교회신학은 선교적 상황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았다. 하비 칸(Harvie M. Conn)은 “신학은 선교적인 반성(reflection) 바로 그 자체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신학은 그러한 선교의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속에서 점진적으로 태동된 것이다.
“하비 칸은 이에 대해 ‘프리 콘스탄틴 시대(the Pre-Constantine centries)의 신학적인 어젠다(agenda)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선교에 의해 형성되었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의 동기가 당시의 교부들로 하여금 기독론의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p. 19, 따라서 선교신학의 시작은 기독교 신학의 시작인 셈이다)
신약성경 27권은 사실상 선교의 문서들이다. 선교적 상황에서 기록되었다. 초대교회는 ‘선교하기’ 공동체였다. 바울 신학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의 신학의 “삶의 정황”(Sitz im Leben)이 선교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먼저 직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바울의 선교를 모르면 바울의 신학을 이해할 수 없다. 오늘날 신학도 마찬가지다. 선교를 모르는 신학은 참 신학일 수 없다. 또한 선교를 모르면 신학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p. 21, 그러나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바울 선교사는 없고 바울 신학만 난무’한다)
2. 성경적 선교: 선교의 동기/자세, ‘십자가 선교’와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
2.1 “왜 선교하려고 하는가?”: 선교사 자신과 파송 교회의 선교 동기 점검
올바른 선교운동은 언제나 성경적인 선명한 정당성과 동기의 순수성을 갖는 것이다. “왜 선교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파송 받은 선교사와 파송교회의 선교의 동기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흐려지면 혼탁한 선교의 물결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선교 현장은 한 마디로 각종 세계관이 부딪히는 영적 전쟁터다. ‘제국주의적 동기/문화적 동기/상업주의적 동기/교회 식민주의적 동기’ 등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선교의 동기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만일 선교사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구하지 않고 교회의 힘이나 국가의 경제력을 의존하거나, 교단의 패권주의나 선교단체의 공적을 앞세우는 선교를 시도한다면 결과는 불행하게도 또 다른 의미의 현대판 제국주의 선교로 나타날 수 있다.” (p. 91)
18세기 영국교회 선교는 문화우월주의(cultural superiority) 선교였다. 하나님 나라가 서구 유럽 문화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복음 전파가 문명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최근 선교계의 BAM(Business as Mission)은 선교지에서 ‘선교 비즈니스 확장’에만 올인할 수 있다. 선교 현장에 토착교회(indigenous church)를 세운다고 하면서, 선교지에 설립하는 교회를 파송교회의 ‘지점교회(branch church)’로 강요한다면 ‘교회 식민주의’가 될 것이다. 선교사는 ‘파송교회의 지점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요, 그 지역(나라)의 토착교회, 곧 자립교회를 세우는 자이다. 서평자는 지점교회들을 여러 선교 현장에서 목도하였다.
2.2 선교의 성경적 동기: ‘주님의 선교 명령 앞에 자발적 순종’
성경적 선교 동기(4가지)는 ‘순종의 동기, 사랑의 동기, 영광의 동기, 예배의 동기’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동기를 먼저 보신다. 우리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왜 또 하고 있느냐?”고 되레 시비를 건다. 한 마디로, ‘빚진 마음’(롬 1:14)이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를 추진하는 능력이다. 선교 헌신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 회복 운동이다. 이런 선교의 동기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3 선교의 성경적 바른 자세: 성육신 선교/동일시/섬김/‘십자가 선교’
‘바른 동기에서 바른 자세’가 나온다. 존재는 언제나 행위 자체보다 앞서게 되어있다. 선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의 바른 자세(품성)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요1:14)은 ‘초문화적’ (cross-cultural) 사건이다. 예수님의 인간과 동일시(sympathizing)처럼 선교사는 현지인과 동일시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교회(선교사)는 섬김으로써 존재한다. 교회는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공동체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요 13:14)가 선교의 실천 원리다. 서평자는 ‘선교는 좋은 모델 되기’라고 정의한다. 선교사의 삶이 곧 선교이다.
‘십자군 선교’가 아닌, ‘십자가 선교’ 정신의 회복이 시급하다. 교회 역사 2,000년을 되돌아볼 때, 교회는 ‘2가지로 선교’를 열심히 하였다. ‘십자군 선교’, ‘십자가 선교’다. 방동섭 교수는 ‘십자군 선교’는 로마제국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지금까지 교회가 시도해 온 ‘힘과 조직을 바탕으로 한 선교’라고 주장하였다. 그 힘을 바탕으로 제국의 변방, 야만 민족과 이슬람교도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는 ‘힘의 선교’(force mission)가 십자군 선교였다. 이는 한국교회 선교도 ‘십자군 선교’라는 것이다.
“십자가 선교는 십자군 선교와는 반대로 주후 1세기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이어온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선교 방식이며, 사도 바울과 그 이후 초대교회가 300년 가까이 시도해 온 선교 방식이다. 십자군 선교는 힘과 정복의 선교이지만 십자가 선교는 섬김과 자기희생의 선교다. 십자군 선교는 힘이 있고, 조직이 있고, 재정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선교였다. 십자가 선교는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희생의 정신만 있으면 언제든 어디서든 실천될 수 있는 선교라고 할 수 있다.” (pp. 107-108, 서평자도 아픈 마음으로 ‘아멘’한다)
방동섭 교수의 이런 주장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 사실상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 1,000년간 선교의 결과는 유럽에 ‘중세 암흑시대’를 낳았다. 마르틴 루터와 칼빈 등 위대한 종교개혁 이후의 선교도 큰 그림으로 볼 때, ‘십자군 선교’의 연장선상 선교이다. <계속>










![[이미지 묵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5/5-17.jpg?w=196&h=128&l=50&t=40)
![[이미지 묵상]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4/9-27.jpg?w=196&h=128&l=50&t=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