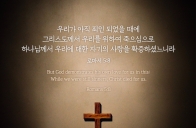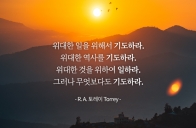중국 요녕성 무순시 동7로에 가면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딕양식의 2층 예배당을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도 큰 손상 없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건물로 위용을 뽐내는 하동교회(전 무순교회, 동칠로교회) 옛 예배당이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일제의 수탈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평안북도 의주와 신의주 출신 기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1930년대 초 세워졌다.
흘러간 세월에 비해 건재한 외관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중국 공산화라는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통과하며 예배당은 기구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 한 때는 중국 지방 정부청사로도 사용되다 교인들의 항의로 다시 예배당이 되었고, 2003년에는 성전을 이전하면서 ‘1913 PURE CAFE(1913????, 뮬러 카페관이라고도 함)에 팔렸다. 지금으로부터 100~60여 년 전, 이 예배당과 얽혀있는 의주와 신의주 출신 신자들의 잊힐 뻔한 삶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역만리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다운 모습과 동시에, 시련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낙망하는 연약한 인간적 모습까지도 그대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 카페로 바뀐 무순교회(동칠로교회) 예배당. 교회 현판 자리에 카페 엠블럼이 붙어있다.
카페와 교회는 모두 1913년 시작되었다. 출처=site.douban.com

과거 무순교회 예배당 흑백사진. 사진제공=이윤선 선생
61년 만에 무순 땅 밟은 이봉옥 사모
“카페가 아닌, 100여 년 전 무순에 복음이 전파된 기념관으로 하루속히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광화문 근처에서 만난 이봉옥 사모(73, 우음사모연구소 소장)의 두 눈에서 간절함이 전해졌다. 이봉옥 사모는 일제의 학정을 피해 신의주에서 무순으로 이주한 이천년 영수(장로교회에서 조직이 잡히지 않은 교회의 행정과 설교를 맡아 인도한 직분, 지금의 장로)와 부인 허용신 집사의 막내딸이다. 이천년 영수와 허용신 집사는 당시 정미소, 철공장, 솜틀공장 등의 사업체를 경영하며 쌓은 재력으로 2층 벽돌교회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부인 허용신 집사는 한경직 목사가 1933년 전도사로 부임한 첫 목회지이자 고향교회인 ‘신의주 제2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을 했다. 한경직 목사와는 거의 온종일 교회에 살다시피 했던 가까운 주일학교 동기였다고 한다. 허용신 집사는 결혼 후 무순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신의주에서 정미소, 철공장, 솜틀공장, 직조공장 등을 운영했다. 여성이지만 사업가로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고, 매우 부유했다.

이봉옥 사모가 ‘무순조선족기독교백년개관’ 책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지희 기자
하동교회는 2013년 무순 조선족 기독교 전파 100주년을 앞두고 2007년 ‘무순조선족기독교백년개관(박계춘, 이윤선 저)’ 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신인 무순교회의 설립 시기와 과정, 초기 역사를 알기 위해 전 교인은 1년 작정 기도를 했다. 당시 이봉옥 사모도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를 담당한 김은섭 목사를 통해 어릴 적 기억에 남아있던 무순교회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1943년 무순에서 출생한 이봉옥 사모는 1947년 11월 17일 어머니 허용신 집사와 3명의 언니와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4년 간 무순에서 살았다.
자신이 살던 동네를 무순시 1대통으로 기억하던 이봉옥 사모의 말을 듣고, 한경직 목사의 행적을 찾고 있던 김은섭 목사는 1대통을 찾아갔으나 2층 고딕양식 벽돌교회는 없었다. 하지만 심양에 파송된 선교사의 도움으로 1대통이 7대통으로 바뀌고, 교회 이름도 무순 제2교회에서 무순교회, 동칠로교회, 그리고 지금의 하동교회로 바뀐 것을 알고 7대통으로 찾아가니 옛날 기억 속의 교회가 그 자리에 있었다.
“‘사모님, 교회 찾았어요’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카페에 넘어가면서 현판 자리에 카페 엠블럼이 붙고 종탑이 없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였습니다. 교회에서 100미터 내에 같은 붉은 벽돌로 지은 단층짜리 우리 집과 시집간 첫째 언니 집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8년 61년만에 무순교회 예배당을 방문한 이봉옥 사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봉옥 사모
이봉옥 사모가 61년만인 2008년 1월 하동교회 박계춘 목사를 찾아갔을 때, 예배당 설립 시기와 과정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얻기 위해 교인들과 1년 작정 기도 중이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봉옥 사모가 그의 어머니 허용신 집사의 생전 말하던 이야기를 기억을 더듬어 4시간 동안 상세히 구술하였고, ‘무순조선족기독교백년개관’에 그 내용이 얼굴 사진과 함께 실렸다.

2008년 하동교회를 방문한 이봉옥 사모가 주일예배 후 인사를 하고 있다. 강단에 있는 사람은
하동교회 박계춘 목사다. 사진제공=이봉옥 사모
1913년 무순 기독교 전파와 함께 시작된 무순교회
무순교회는 1913년 무순 조선족 신자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공교롭게도 2013년 예배당을 사들인 카페 ‘1913 PURE CAFE’와 설립연도가 같다. 무순교회의 설립 역사는 두 가지 설이 있다. 1986년 동칠로교회에 부임해 17년간 목회를 한 리찬길 선교사에 의하면, 1913년 황룡호 장로의 인솔로 무순교회가 세워져 성도들이 모금한 돈으로 단층 벽돌 기와집 8칸과 사택을 지었다. 1914년 조선 평안북도 의주군 의산노회가 김창덕 목사를 무순교회로 파견했고, 1934년에는 같은 노회에서 전재선 목사를 파견해 당시 황해도 재녕벽돌공장의 붉은 벽돌을 지원받아 지금의 2층 예배당을 지었다고 주장한다. 1939년 무순교회는 조선에서 김성여 목사를 초청했고, 김성여 목사는 1948년 10월 31일 무순이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에 함락되기 전인 1948년 6월까지 무순교회에서 목회했다. 김성여 목사의 딸인 김선복 여사는 무순 출생으로, 4살이던 1948년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천진에 도착, 배를 타고 한국에 가려 했으나 뱃길이 끊겨 몇 달간 천진에서 지내다 겨우 배를 타고 귀국했다. 김성여 목사는 이후 한국 부산진교회를 담임하다 은퇴했다.
이 중에서 붉은 벽돌을 황해도 재녕벽돌공장에서 옮겼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일제 치하의 험난한 시기에 그 많은 벽돌을 수백 킬로미터나 옮기는 과정에서 압록강까지 건너야 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봉옥 사모는 “어머니에게 듣기론, 붉은 벽돌은 아버지 이천년 영수와 신도들이 자금을 모아 심양에서 구입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달구지로 한 차 한 차 무순으로 실어 나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년 영수는 시간이 있을 때면, 도시락을 싸 들고 심양에 기차를 타고 가서 직접 달구지로 벽돌을 실어 날랐다고 한다.

1938년에 찍은 무순교회 성탄절 기념사진. 앞줄 맨 오른쪽 안경을 쓰고 앉아 있는 사람이 이봉옥 사모의
아버지 이천년 영수, 앞줄 맨 왼쪽 한복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이 이봉옥 사모의 어머니 허용신 집사다.
맨 뒷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안경을 쓴 여성은 이봉옥 사모의 첫째 언니 이봉재 권사(1923년생 신의주 출생)로,
당시 무순 일대 유행의 선두주자였다고 한다. 어머니 오른쪽 옆 흰 리본을 단 아이는 셋째 언니
이봉실 씨(아들은 고승철 박사). 사진제공=이윤선 선생
이천년 영수와 허용신 집사는 모두 신의주에서 출생했다. 책과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던 전형적인 학자였던 이천년 영수와 달리 ‘치마 두른 남자’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부인 허용신 집사는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부를 이뤘다. 그러나 일본군은 예수를 믿는 부유한 가정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독립 자금을 몰래 대다가 들키면서 일본군의 압박은 더욱 커졌다.
이천년 가족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요녕성의 중심 도시이던 심양이 아닌, 석탄광산이 있던 산촌인 무순시를 선택해 조용히 이주했다. 이주 년도는 1924년부터 1930년대 초 사이로 추정한다. 운영하던 사업체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수익금을 받았다. 무순에서 새로 시작한 정미소, 솜틀공장, 철공장 등의 사업도 번창하는 가운데, 고용한 중국인들이 열정과 책임감이 없자 신의주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가정 6가구를 데려와 책임을 맡겼다고 한다. 이봉옥 사모는 “지금도 집 근처 정미소, 솜틀공장, 철공장이 돌아가던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막던 어린 시절이 생생하다”고 말했다.(계속)
흘러간 세월에 비해 건재한 외관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중국 공산화라는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통과하며 예배당은 기구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 한 때는 중국 지방 정부청사로도 사용되다 교인들의 항의로 다시 예배당이 되었고, 2003년에는 성전을 이전하면서 ‘1913 PURE CAFE(1913????, 뮬러 카페관이라고도 함)에 팔렸다. 지금으로부터 100~60여 년 전, 이 예배당과 얽혀있는 의주와 신의주 출신 신자들의 잊힐 뻔한 삶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역만리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다운 모습과 동시에, 시련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낙망하는 연약한 인간적 모습까지도 그대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 카페로 바뀐 무순교회(동칠로교회) 예배당. 교회 현판 자리에 카페 엠블럼이 붙어있다.
카페와 교회는 모두 1913년 시작되었다. 출처=site.douban.com

과거 무순교회 예배당 흑백사진. 사진제공=이윤선 선생
“카페가 아닌, 100여 년 전 무순에 복음이 전파된 기념관으로 하루속히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광화문 근처에서 만난 이봉옥 사모(73, 우음사모연구소 소장)의 두 눈에서 간절함이 전해졌다. 이봉옥 사모는 일제의 학정을 피해 신의주에서 무순으로 이주한 이천년 영수(장로교회에서 조직이 잡히지 않은 교회의 행정과 설교를 맡아 인도한 직분, 지금의 장로)와 부인 허용신 집사의 막내딸이다. 이천년 영수와 허용신 집사는 당시 정미소, 철공장, 솜틀공장 등의 사업체를 경영하며 쌓은 재력으로 2층 벽돌교회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부인 허용신 집사는 한경직 목사가 1933년 전도사로 부임한 첫 목회지이자 고향교회인 ‘신의주 제2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을 했다. 한경직 목사와는 거의 온종일 교회에 살다시피 했던 가까운 주일학교 동기였다고 한다. 허용신 집사는 결혼 후 무순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신의주에서 정미소, 철공장, 솜틀공장, 직조공장 등을 운영했다. 여성이지만 사업가로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고, 매우 부유했다.

이봉옥 사모가 ‘무순조선족기독교백년개관’ 책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지희 기자
자신이 살던 동네를 무순시 1대통으로 기억하던 이봉옥 사모의 말을 듣고, 한경직 목사의 행적을 찾고 있던 김은섭 목사는 1대통을 찾아갔으나 2층 고딕양식 벽돌교회는 없었다. 하지만 심양에 파송된 선교사의 도움으로 1대통이 7대통으로 바뀌고, 교회 이름도 무순 제2교회에서 무순교회, 동칠로교회, 그리고 지금의 하동교회로 바뀐 것을 알고 7대통으로 찾아가니 옛날 기억 속의 교회가 그 자리에 있었다.
“‘사모님, 교회 찾았어요’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카페에 넘어가면서 현판 자리에 카페 엠블럼이 붙고 종탑이 없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였습니다. 교회에서 100미터 내에 같은 붉은 벽돌로 지은 단층짜리 우리 집과 시집간 첫째 언니 집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8년 61년만에 무순교회 예배당을 방문한 이봉옥 사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봉옥 사모

2008년 하동교회를 방문한 이봉옥 사모가 주일예배 후 인사를 하고 있다. 강단에 있는 사람은
하동교회 박계춘 목사다. 사진제공=이봉옥 사모
무순교회는 1913년 무순 조선족 신자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공교롭게도 2013년 예배당을 사들인 카페 ‘1913 PURE CAFE’와 설립연도가 같다. 무순교회의 설립 역사는 두 가지 설이 있다. 1986년 동칠로교회에 부임해 17년간 목회를 한 리찬길 선교사에 의하면, 1913년 황룡호 장로의 인솔로 무순교회가 세워져 성도들이 모금한 돈으로 단층 벽돌 기와집 8칸과 사택을 지었다. 1914년 조선 평안북도 의주군 의산노회가 김창덕 목사를 무순교회로 파견했고, 1934년에는 같은 노회에서 전재선 목사를 파견해 당시 황해도 재녕벽돌공장의 붉은 벽돌을 지원받아 지금의 2층 예배당을 지었다고 주장한다. 1939년 무순교회는 조선에서 김성여 목사를 초청했고, 김성여 목사는 1948년 10월 31일 무순이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에 함락되기 전인 1948년 6월까지 무순교회에서 목회했다. 김성여 목사의 딸인 김선복 여사는 무순 출생으로, 4살이던 1948년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천진에 도착, 배를 타고 한국에 가려 했으나 뱃길이 끊겨 몇 달간 천진에서 지내다 겨우 배를 타고 귀국했다. 김성여 목사는 이후 한국 부산진교회를 담임하다 은퇴했다.
이 중에서 붉은 벽돌을 황해도 재녕벽돌공장에서 옮겼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일제 치하의 험난한 시기에 그 많은 벽돌을 수백 킬로미터나 옮기는 과정에서 압록강까지 건너야 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봉옥 사모는 “어머니에게 듣기론, 붉은 벽돌은 아버지 이천년 영수와 신도들이 자금을 모아 심양에서 구입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달구지로 한 차 한 차 무순으로 실어 나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년 영수는 시간이 있을 때면, 도시락을 싸 들고 심양에 기차를 타고 가서 직접 달구지로 벽돌을 실어 날랐다고 한다.

1938년에 찍은 무순교회 성탄절 기념사진. 앞줄 맨 오른쪽 안경을 쓰고 앉아 있는 사람이 이봉옥 사모의
아버지 이천년 영수, 앞줄 맨 왼쪽 한복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이 이봉옥 사모의 어머니 허용신 집사다.
맨 뒷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안경을 쓴 여성은 이봉옥 사모의 첫째 언니 이봉재 권사(1923년생 신의주 출생)로,
당시 무순 일대 유행의 선두주자였다고 한다. 어머니 오른쪽 옆 흰 리본을 단 아이는 셋째 언니
이봉실 씨(아들은 고승철 박사). 사진제공=이윤선 선생
이천년 가족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요녕성의 중심 도시이던 심양이 아닌, 석탄광산이 있던 산촌인 무순시를 선택해 조용히 이주했다. 이주 년도는 1924년부터 1930년대 초 사이로 추정한다. 운영하던 사업체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수익금을 받았다. 무순에서 새로 시작한 정미소, 솜틀공장, 철공장 등의 사업도 번창하는 가운데, 고용한 중국인들이 열정과 책임감이 없자 신의주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가정 6가구를 데려와 책임을 맡겼다고 한다. 이봉옥 사모는 “지금도 집 근처 정미소, 솜틀공장, 철공장이 돌아가던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막던 어린 시절이 생생하다”고 말했다.(계속)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함께 볼만한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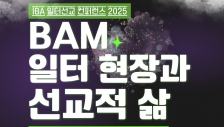










![[이미지 묵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5/5-17.jpg?w=196&h=128&l=50&t=40)
![[이미지 묵상]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4/9-27.jpg?w=196&h=128&l=50&t=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