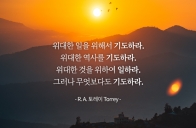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후 돌아가는 기내에서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순 없었다’는 말을 남겼다. 물론 이는 세월호 참사로 아픈 이들을 보듬는 의도의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고통 혹은 고난은 없어져야 할 악이라는 전제를 다분히 떠올리게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후 돌아가는 기내에서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순 없었다’는 말을 남겼다. 물론 이는 세월호 참사로 아픈 이들을 보듬는 의도의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고통 혹은 고난은 없어져야 할 악이라는 전제를 다분히 떠올리게 한다.그래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런 이들을 질시하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 ‘무슨 죄가 많아서….’ ‘뭔가 회개 거리가 있을 거야….’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 망대의 붕괴라는 끔찍한 재난이 있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빗나간 생각을 단번에 교정시키셨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눅13:4)
고통은 누구만의 것이 아니다. 온 인류의 것이다. 이 시각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 고통의 쓰라림 앞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고통은 결코 배척해야 할, 서둘러 탈피해야 할 악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실과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은 결론이 아니다. 영원 쪽에 그 결론이 있다. 그렇다면 현실에 잔뜩 경도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잠을 깨우는 커다란 확성기가 필요하다. 바로 고통이요, 고난이다.
가을 특새를 진행했다. 그렇게 힘들게 새벽에 나온 이들이 예배 후 단 5분도 못 견디고 기도의 자리를 뜨는 걸 봤다. 그 깊은 영혼의 잠을 무엇이 깨울 수 있을까. 바로 고난이다. 아픔이다. 재난이다.
오랜 고난에 처한 이들, 오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이들…. 그들을 곁눈으로 보지 마라. 분명 그의 영혼은 나보다 더 깨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오늘도 교회 강단에서 외쳐지는 숱한 고통과 고난에 대한 메시지들을 듣는다. 거기서 이겨야 한다는 설파들을 접한다. 이렇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선포된다. 그래서 교인들은 질병에 걸리면 오직 낫기만을 기도한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되기만을 간구한다. 그 상황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다. 문제에서의 탈출,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는다. 아, 기도의 가벼움이여.
때로는 내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잠잠히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필요하면 고난과 친해져도 괜찮다. 아픔과 손을 잡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도 괜찮다.
어느 북한 선교사의 간증이다. 그는 접경에서 밥을 나누는 사역을 한다.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라며 끝내 북조선에 남기를 택한 79세 할아버지에게서 그가 느낀 것은 일종의 경외감이었다.
평안의 떡만을 먹는 이들이 말하는 고난은 가볍기 이를 데 없다. 그저 고난을 피하라는 외침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한다. 고난은 몸부림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난은 천형(天刑)이 아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는 자신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함께 은밀한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이진우 목사(EATS교장, 새소망교회 담임)
오픈도어선교회 제공
함께 볼만한 기사












![[이미지 묵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5/5-17.jpg?w=196&h=128&l=50&t=40)
![[이미지 묵상]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4/9-27.jpg?w=196&h=128&l=50&t=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