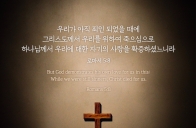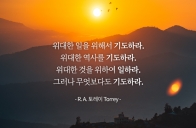최근 본 두 영화가 인상적이다. 각기 기독교에 대한 너무 다른 이미지를 세상에 전달했다. 하나는 지난 성탄절 즈음에 KBS에 방영한 주기철 목사에 관한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자, 더 오리지널’이다. 하나는 기독교 목사를 다룬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부패상을 다룬 영화이다. 전자는 목사가 주인공이지만, 영화를 본 시청자들을 그 영화에서 교회를 보기보다는 한 인간과 국가를 보게 된다. 후자는 기독교인과 관련된 대사가 5초 정도 등장하지만, 오늘 세상이 바라다보는 교회의 현실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목사 주기철’에서 주기철 목사는 한 교회의 목사로 비춰지기보다는 독립운동가로, 혹은 일제에 억압받는 민중의 정신적 지주로 비춰진다. 반면 ‘내부자’에 등장한 기독교인(부패한 언론인 이강희)은 자신의 비리가 탄로나게 되고 절박해지자 하나님의 혜안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신앙인으로 등장한다. 5초 정도 밖에 안 되는 기도 속에서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전달된다.
최근 본 두 영화가 인상적이다. 각기 기독교에 대한 너무 다른 이미지를 세상에 전달했다. 하나는 지난 성탄절 즈음에 KBS에 방영한 주기철 목사에 관한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자, 더 오리지널’이다. 하나는 기독교 목사를 다룬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부패상을 다룬 영화이다. 전자는 목사가 주인공이지만, 영화를 본 시청자들을 그 영화에서 교회를 보기보다는 한 인간과 국가를 보게 된다. 후자는 기독교인과 관련된 대사가 5초 정도 등장하지만, 오늘 세상이 바라다보는 교회의 현실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목사 주기철’에서 주기철 목사는 한 교회의 목사로 비춰지기보다는 독립운동가로, 혹은 일제에 억압받는 민중의 정신적 지주로 비춰진다. 반면 ‘내부자’에 등장한 기독교인(부패한 언론인 이강희)은 자신의 비리가 탄로나게 되고 절박해지자 하나님의 혜안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신앙인으로 등장한다. 5초 정도 밖에 안 되는 기도 속에서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전달된다.영화 ‘밀양’ 이후 영화에서 기독교인은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비양심의 뻔뻔스러움과 인격의 이중성을 희화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로 등장한다. 영화 ‘밀양’에서 주인공의 하나님께 대한 절망(사실은 교회에 대한 절망)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는 떳떳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 때문이었다. 영화 ‘내부자’에서도 기독교인은 사회의 기득권 계층으로 이미지를 가진다. 동시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복의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 간절해 지는, 자기 중심적이며 이웃, 즉 공적 양심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그려진다. 과도한 신앙의 개인주의화는 한 그리스도인의 개인 신앙과 공적 정체성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날 사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기독교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 같다. 성경이 정의하는 기독교인(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종착역이 아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오히려 복이 되라고 하신다(창 12:1~3).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았다고 말한다(Blessed to be a blessing). 이것이 그리스도인(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복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복을 받으라고 말한다. 출발이 잘못된 것 같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는 단지 목사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로 그려졌다. 물론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은 그의 신앙적 결단이었다. 그런데 그의 신앙적 결단과 이웃(민족)의 과제(독립)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선상에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 기독교인은 그들의 신앙적 결단과 이웃의 공익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기독교의 성장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맞물려 있었다. 가난했던 기독교인이-기독교인만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난에서 풍요로 옮겨가고 있었고 그 안에 기독교인들도 있었다-개인적인 풍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오해 한 것이다. 어떤 행동이 개인적인 풍요에 도움이 된다면, 공적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내야 하는 축복으로 복음을 이해한 것이다.
선교도 마찬가지이다. 때론 우리의 선교적 행위가 이웃의 유익과 대척점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교적 존재가 아니면서 선교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교적 존재가 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상임대표)
함께 볼만한 기사













![[이미지 묵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5/5-17.jpg?w=196&h=128&l=50&t=40)
![[이미지 묵상]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4/9-27.jpg?w=196&h=128&l=50&t=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