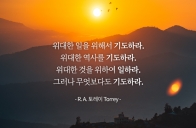|
막냇동생은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돼 열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자, 동네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사리 같은 조그만 손등에 주삿바늘을 꽂고 힘없이 누워있는 동생은 며칠이 지나도 열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 대부분 어머니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새벽에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의 칠성을 향해 가족의 건강을 빌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병이 나면 담벼락에 눈을 그려놓은 후 침을 꽂기도 하셨고, 감기몸살에 걸리면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 짚 인형과 함께 길거리에 뿌리시는 등 푸닥거리를 하셨습니다. 아픈 막내를 위해 어머니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 시작하셨지요.
 |
악귀 쫓기에 여념이 없던 그 할아버지와 순간 제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방 뒷문으로 뛰어가 뒷마당의 텃밭에 쳐 놓은 나무 울타리를 소리도 없이 넘어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한 채 막냇동생은 가족 중 가장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계속>
이장우 일터사역자
함께 볼만한 기사











![[이미지 묵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5/5-17.jpg?w=196&h=128&l=50&t=40)
![[이미지 묵상]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4/9-27.jpg?w=196&h=128&l=50&t=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