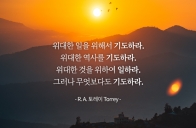"내가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 여름날 아침이면 나는 자주 호수 한가운데로 보트를 저어 가서는 그 안에 길게 누워 몽상에 잠기곤 했다. 그러고는 산들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떠가도록 맡겨 놓으면 몇 시간이고 후에 배가 기슭에 닿는 바람에 몽상에서 깨어나곤 했는데, 그제야 나는 일어서서 운명의 여신들이 나를 어떤 물가로 밀어 보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시절은 게으름 부리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고 생산적인 작업이던 때였다. ... 그 당시 나는 정말로 부유했다. 금전상으로가 아니라 양지바른 시간과 여름의 날들을 풍부하게 가졌다는 의미에서 그러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들을 아끼지 않고 썼다."(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중에서)
소로의 <월든>을 완독한 건 서른을 넘기고서였다. 소로가 이 책을 쓴 나이가 대략 지금의 나와 비슷했다. 그래서인지 그가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욱 와 닿았다. 나는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 어느 가을, 해 뜨는 바다를 보러 제멋대로 기차에 올라타 동해에서 밤을 새우고는, 오래도록 수평선을 바라보던 순간을 생각했다. 학교 뒷산에 올라 몇 점 보이지도 않는 별을 한참 올려다보던 새벽들도 떠올랐다. 소로의 말대로였다. 그 시절, 나는 분명 이 세계를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다.
소로의 월든 호숫가로 대변될 수 있는 먼 땅, 이곳이 아닌 외부의 세계, 고요하고 아늑한 어떤 장소에 대한 열망은 분명 청춘 내내 나에게 아주 가까이 있었다. 나는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마음을 품은 채로 이 도시를 사랑했다. 아름다운 카페가 곳곳에 널려 있고, 무수한 만남이 예견되어 있으며, 화려한 삶의 가능성을 품은 이 도시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동시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바다가 있는 어느 고장으로 떠나 오랫동안 여행을 하거나 언제까지고 머물고 말 것이라는 욕망 역시 놓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으로, 나는 정말로 그런 먼 땅의 고즈넉한 삶을 살아 낸 기분이 든다. 그저 이따금씩 찾아간 바다와 자연이었지만, 매일같이 그 땅들을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결국 모든 게 추억 속의 이미지가 된다면, 그것이 실제였건 상상이었건 얼마나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호숫가에 집을 짓고 이 년 정도 살았다는 <월든>의 이야기는 언뜻 들으면 그리 대단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 정도쯤이야 흔히 있는 일이라며, 우리는 더 역동적이고 화려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다. 이를테면 백 일간 인도 전역을 떠돈 여정, 회사를 관두고 트럭을 개조해서 떠난 세계 일주, 무일푼으로 남미의 농장에서 일하며 여행한 경험 같은 이야기들 말이다. 그러나 소로의 여정은 단순히 외적으로 복잡다단한 경험이 아니었다. 그는 이야깃거리를 위해서, 삶의 막연한 이미지를 향해 떠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으며,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고 했으니, 삶은 그처럼 소중한 것이다. 나는 생을 깊게 살기를,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했으며, 강인하고 엄격하게 살아, 삶이 아닌 것은 모두 때려 엎기를 원했다."
그가 떠난 것은 내면의 절실함, 삶의 진실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현실의 온갖 거추장스러운 의무를 모두 걷어 낸 상태에서, 순수한 삶의 핵심에 도달하여 진실을 느껴 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가장 소박한 조건에서, 오로지 삶만이 남은 상황에서 이 생을 살아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 과거로부터 자신을 옭아매고 있는 모든 관계, 사회적으로 규정된 갖가지 이름을 벗어던진 상태로 '지금 여기'의 삶에 있어 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그의 동기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부적인 것이었다는 점이야말로 그의 체험이 인류사에 족적을 남기게 된 이유다. 그의 기록은 단순히 호숫가에서의 삶에 대한 수기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어떻게 자기 내부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주변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보이고 감각되는지, 나아가 어떠한 생각으로 명료하게 삶을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 관점에서 나 역시 내 청춘을 지배했던 상상의 삶을 조금은 옹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완전히 이 땅을 떠나지 못한 채, 골방에 갇혀 지냈던 몽상의 나날들이 그 자체로 소로의 추구와 전적으로 무관하지는 않았다고 말이다. 왜냐하면 나는 자주 내 방을 섬으로 만들고 싶어 했으니까. 휴학을 하고, 기존의 관계들과 멀어지면서, 나는 철저히 나를 허공과 같은 상태로 몰아넣는 시도를 했다. 자취방의 조각난 창문으로 들어오던 달빛과 오후의 햇살과 내 손에 쥐어진 책과 노트에만 의지해 삶을 만나 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서른이 넘어 읽은 이 고전이 낯설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정말이지, 나는 언젠가 그와 같은 호숫가에 살았던 것만 같다.
- 『고전에 기대는 시간』 중에서
(정지우 지음 / 을유문화사 / 332쪽 / 15,000원)<북코스모스>













![[이미지 묵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5/5-17.jpg?w=196&h=128&l=50&t=40)
![[이미지 묵상]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4/9-27.jpg?w=196&h=128&l=50&t=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