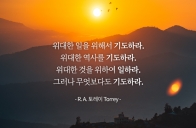선교현장에서 영적사역과 전문사역에 대한 이원론적 시각과 목회자 선교사와 비목회자 출신 선교사의 협력 문제는 오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19일 선교한국 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포럼에서 IT변혁연대 대표 김기석 한동대 교수는 지상대명령의 완성을 위해 전도, 양육, 교회공동체 구성을 위한 영적사역과 비자를 얻고 유지하기 위한 비즈니스 활동 등 전문사역의 조화와 통합, 또 목회자 선교사와 비목회자 출신 선교사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선교현장에서 영적사역과 전문사역에 대한 이원론적 시각과 목회자 선교사와 비목회자 출신 선교사의 협력 문제는 오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19일 선교한국 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포럼에서 IT변혁연대 대표 김기석 한동대 교수는 지상대명령의 완성을 위해 전도, 양육, 교회공동체 구성을 위한 영적사역과 비자를 얻고 유지하기 위한 비즈니스 활동 등 전문사역의 조화와 통합, 또 목회자 선교사와 비목회자 출신 선교사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선교사의 사역적 통합성 및 텐트메이커 선교사의 사역적 진실성의 과제,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의 파트너십의 가능성’에 대한 발제에서 그는 영적사역과 전문사역이 사역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원인을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이분법적 사역의 이해에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뿐 아니라 선교사들 안에도 전문사역이 영적사역보다 덜 중요하고, 오직 영적사역만이 목표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한 그는 “불가피하게 전문사역에만 시간을 보낼 경우 선교사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영적사역을 위해 전문사역을 위장하거나 불성실하게 진행할 경우 사역적 진실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두 사역을 조화,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은사에 따라 팀사역을 하거나 전문사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 선교사나 평신도 선교사 모두 전문사역을 단지 비자를 위한 수단적 목표가 아니라 영혼들과 사귐, 나눔이 있는 영적사역의 터로 만들어야 하며, 일과 직업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문사역도 길게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며 “한 선교단체가 최근 10~20년 사이 북아프리카 이슬람 지역에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100년 동안 3~5세대에 걸쳐 선교사들이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고 그 과정 속에서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며 3~4세대에 걸친 열매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신도를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와 선교현장의 분위기에 대해 그는 한국의 유교문화에 대한 계급적 사고방식, 자발적 혹은 자칭 선교사들의 증가 등을 이유로 들며 “공적 파송과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선교사’라 부르지 말고 ‘사역자’로 부를 것을 제안하며,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사역자로서 충분히 사역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그는 “평신도 사역자와 목회자는 서열관계,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역자, 파트너십 관계”라며 “사역 현장에서 팀 리더에 대한 순종, 사역 은사와 전문성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 및 상호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지인들의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형성하려면 목회자 선교사는 현지 목회자를 세워야 하고 평신도 선교사는 건강한 현지인 평신도를 세워야 할 것”이라며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역 영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선교현장에서 전문인 선교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국내 일터사역 현장에서 훈련 받은 전문인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이 선교와 일터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고 ‘텐트메이커 선교사’ 또는 ‘텐트메이커 사역자’로 활동하도록 물꼬를 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MF 동원담당 손창남 선교사는 이날 응답에서 “영적사역과 전문사역의 이원론적 분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선교현장 경험에 비춰볼 때 목회자 선교사, 비목회자 출신 선교사는 중요하지 않고 선교사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선교현장에서 담임목사는 목회자 출신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인 리더가 해야 한다”며 “비목회자 출신 선교사는 전도, 양육, 교회개척 등의 영적사역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목회자 선교사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인 경우 반드시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함께 볼만한 기사













![[이미지 묵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5/5-17.jpg?w=196&h=128&l=50&t=40)
![[이미지 묵상]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https://missionews.co.kr/data/images/full/14264/9-27.jpg?w=196&h=128&l=50&t=40)